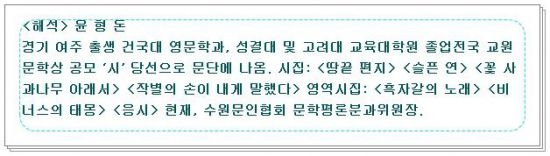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세월
이 300년이 넘는다 이제 난 지쳤다 왜
아직도 소식이 없소? 문지기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다 겨울 저녁 해가 진다 눈이
내린다 문앞엔 작은 등불이 걸린다 난 문
앞에 앉아 눈을 맞는다 등받이 없는 의자
에 앉아 문지기에게 다시 묻는다 왜 아직
도 소식이 없소? 그건 당신이 바란 거야
문지기가 대답한다 문앞에 앉아 300년이
흐른다.
이승훈(1942~ 2018)
강원 춘천 출생, 박목월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데뷔 아방가르드 시인이면서 이론가인 이승훈은 김수영, 김춘수의 뒤를 이어 시와 시론 모두에서 지속적 탐색과 변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詩史에 일정한 충격파와 독자적인 미학을 구축함
시 읽기/ 윤 형 돈
새로운 것, 혁신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 시인 이승훈은 시란 그저 살면서 겪은 작은 삽화를 그대로 옮겼을 뿐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의 시는 창조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은유나 상징도 없고 요컨대 미적 가치도 없다는 것,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오로지 현실을 그대로 옮기는 것, 그러나 리얼리즘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세월이 무려 300년이 넘는다. 그것도 등받이가 없는 좌불안석의 불안정한 의자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린다. 왜, 무엇을 기다리는 지 기다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마냥 기다린다.
문지기에게 물어도 좋은 소식은 아직 없다 사계가 지나고 기다림의 끝인 겨울에 오고 눈이 오고 문 앞에 등불이 걸려도 역시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온다는 기미조차도 없다 어느 날 문득 문지기가 대답한다. 그건 당신이 바라는 바였다고 당신 스스로 설치해 놓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무량한 세월을 하릴없이 보내고 있는 거라고. 아뿔싸!
이건 어쩌면 기다림의 실체는 확연히 몰라도 그대 영혼의 자유의지가 사붓이 찾아가는 바로 그곳, 그곳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