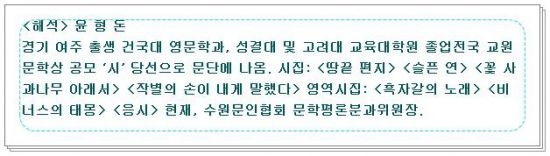황동규(1938~)
아버지 황순원
서울대 대학원 영문학 박사
1958년 현대문학 ‘시월‘, ’즐거운 편지‘ 등으로 추천
1965년 시집 ‘비가’ 1972년 ‘평균율 2’ 출간
1984년 문학선 ‘풍장’, 1986년 ’악어를 조심하라고?‘ 출간
1988년 연암문학상, 김종삼 문학상 수상
1993년 ‘미시령 큰바람’ 출간, 기타 서울대 명예교수 외
오, 눈이로군
그리고 가만히 다닌 길이로군
입김 뒤에 희고 고요한 아침
잠깐잠깐의 고요한 부재(不在)
오, 눈이로군
어떤 돌아옴의 언저리
어떤 낮은 하늘의 빛
한 점 빛을 가진 죽음이 되기 위하여
나는 꿈꾼다, 꿈꾼다, 눈빛 가까이
한 가리운 얼굴을,
한 차고 밝은 보행을.
시 읽기/ 윤형돈
연일 건조주의보에 초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리다 요 얼마 전 깜짝 눈이 오는가 싶더니 또 잿빛 하늘만 꾸물거리고 반가운 강설 기미는 아예 없다. ‘눈’ 하면 우선, 곧바로 떠오르는 게 김진섭의 ‘백설부’에 묘사된 경이와 찬탄의 수필 문장이요, ‘살아있는 눈’을 바라보며 ‘기침‘을 하던 김수영의 첨예한 감수성과 군사독재 시절 ’백색의 계엄령‘으로 각인된 최승호의 ’대설주의보‘,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푹푹 내리는 백석의 ’눈‘, ’먼 데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로 엿들은 김광규의 ’설야‘가 문득문득 떠오른다.
‘즐거운 편지’에서 눈이 퍼붓고 또 그칠 것을 믿었던 황동규 시인에게도 우울한 옛 시를 읽는 것과 같은 ‘눈’이 또 내린다. 여기서 그의 ‘눈‘은 단순히 자연의 아들이나 경쾌한 족속 혹은 무질서의 쾌락이거나 겨울다운 서정시의 읊조림이 아니요, 고도로 정련된 지성의 ‘눈‘이다
안타까운 사랑에 대한 명징한 영혼의 부르짖음이랄까 변증으로 고통과 대결하는 시인의 엄숙한 정신을 한껏 보여준다. 고요한 아침에 ’잠깐잠깐의 고요한 부재(不在)‘는 무엇일까? 절대와 부재 사이에 내던져진 자아의 고독한 삶의 내부일까 ’오, 눈이로군!‘ 영탄의 언저리에 또 어떤 빛과 그림자의 환영이 명멸했다가 다시 ’한 점 빛을 가진 죽음이 되기 위하여‘ 사라졌단 말인가 꿈속의 눈, 눈 속의 꿈길은 그래서 숨길 수 없는 사랑을 찾아 어디쯤에선 ’차고 밝은 보행‘을 마치 운명에의 각성과 사랑을 암시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아(高雅)한 어미(語尾)로 형이상학적이던 시인의 ’눈‘이 ’조그만 사랑 노래‘에 와선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 하고/ 눈 뜨고 떨며 한 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으로 한없이 인간적으로 소박하게 내릴 뿐이니 존재의 본질을 떠난 허공에서 제 아무리 형이상학의 언어로 수식하고 덧붙여 상찬(賞讚)한들 무엇 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