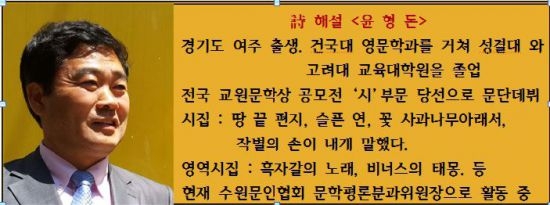김학주(1964~)
경기도 수원출생
월간 한울문학 신인상 시부문 수상
한국문협 수원지부 회원
시집: ‘사랑별을 산에서 만났습니다‘ ’사랑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랑별 다방‘
▲ 이원규 시인과 황백조 시인의 결혼식 사진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못난 모습만 보이고
당신 가슴에 박은 슾픈 대못이
몇 개나 되는지
당신이 잠든 사이
과거를 빌며 하나씩 빼낼 때마다
미어지는 울음조차 토해낼 수 없어
이래저래 한恨 인데
당신은 얼마나
바보 같은 용서의 마음을 가졌길래
그토록 웃으며 잠을 자는 지
낮에도 그렇게 웃기만 하더니 말입니다.
시 읽기/ 윤형돈
‘아내 2‘란 시 제목을 보면, 전에 벌써 ’아내 1‘을 지었고 앞으로도 계속 3, 4, 5.. 속편이 쓰 여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아내라는 말, 개인에 따라서는 익숙해서 낯설고, 함께 라서 다른 여운으로 들리기도 한다. 얼핏 예전에 지독하게 낮은 저음의 가수가 부르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기억한다. ’젖은 손이 애처러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지그시 눈을 감은 구구절절한 가사가 지금은 왜 그리도 우스꽝스러운 엄숙주의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허다한 죄 많은 남편들에겐 영원히 부를 찬송 제목이 아닌가 한다. ’아내‘라는 말은 참으로 한 많은 사연을 안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안사람, 집사람, 여보, 여편네, 안식구, 마누라, 내자, 부인, 밥줘, 처 등등 이 가운데 ’밥줘‘란 호칭은 어째 칭얼대는 아이처럼 모성적이고 현실적인 구석이 있다. 나보다는 제법 연하인 학주 시인더러 나는 학다리, 각주脚註 등으로 부른 적이 있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없이 짧고, 쉽고, 간결하고, 건강한 비타민 같은 시를 자주 뿜어낸다. 등산으로 다져진 몸매가 시의 근력을 키워주고 있으며 시상 전개도 공연히 골을 썩이거나 복잡하게 전개하지 않고 툭툭 동백 모가지 끊어지듯 아쌀하고 선명하다. 평상시 그의 시 키워드는 줄곧 ’사랑별‘이었지만, 이번엔 그 일환으로 안방마님인 ’아내‘를 택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쏘곤쏘곤 ‘사랑의 맹세’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언약한 ‘100년의 약속’이 무색하게 그동안 참으로 많은 애증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못난 모습만 보이고’ 후회막심입니다 안사람과의 싸움은 칼로 물 베기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불의 고리’였습니다 못난 사람으로 집사람에게 박은 못은 잔챙이 못부터 대못까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젠 정말 못 박힌 가슴을 탕탕 치며 고해하러 성당이 아니라 뼈 속 깊이 박힌 못을 빼러 ‘영혼의 대장간’을 찾아 가야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 지’ 도대체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보, 하루 고단에 지쳐 쓰러진 ‘당신이 잠든 사이’ 지나온 과거지사를 돌아보며 자책하고 통회자복해 보아도 ‘울음조차 토해낼 수 없어’ 회한의 가슴이 됩니다. 설사 마늘을 까주면서까지 마누라 당신 마음을 돌이키려 애교를 부려 본들 내자內子 집 밖에서 저지른 과오는 ‘바보 같은 용서의 마음’ 아니고선 감당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
실로 어이없는 남편을 향해 웃음인지 눈물인줄 모르게 참고 또 참아온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갖은 분란은 다 일으켜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어린애같이 ‘밥 줘!’ 이 한마디에 당신은 또 그저 어이없어 웃고 마는구려. 여보, 못난 나를 하해河海같은 가슴으로 또 한 번 품어주시구려. 부디 안과 밖의 세상에서, 바람 잘 날 없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어루만져주는 ‘영원한 여성’이자 ‘소요逍遙의 고요’로 오래 오래 남아주길 진정으로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