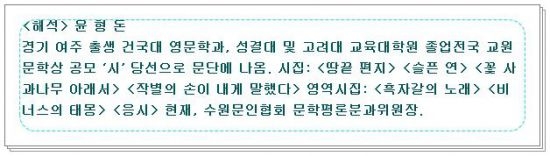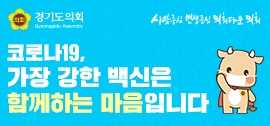부산에서 태어나 2010년 월간 <창조문예>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 시작
첫 시집 <뒤가 이쁜>이 있다
굵은 자물통이 비틀려 있고
모아뒀던 헌 옷들이 사라진다
CCTV로 알아보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챙 모자 구부정하게 눌러 쓴 남자
컴컴한 골목 전전하며
묵직한 자물통 들추고 있다
헌옷 무게만큼 버팅기는 허리
가까스로 추스르며
어둠 속으로 가뭇해지던
혹독한 생이
앞을 가린다
그날 이후였을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안습
휴지통이 넘치고 불면의 밤은 더욱 길어진다
숨통을 조이는 미세먼지는
마스크와 안구건조증으로 앞가림 되고
헌 옷 함 지날 때 마다
어룽이는 그림자
찌그러진 자물쇠의 시선이
비스듬히 허공을 문다
시 읽기/ 윤형돈
물체가 빛을 가리면 이면에 검은 형상이 드러난다. 최첨단 과학 문명의 뒷골목에 나타나는 ‘낡고 헌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폐휴지 줍는 노인들’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폐품 수집을 한 기억이 도대체 언제인데 저분들은 아직도 밤 낮 없이 폐휴지 수거로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구부정하게 ‘컴컴한 골목 전전하며’ 고작 동전 몇 닢 손에 쥐려고 새벽 출근 시간보다 먼저 일어나 위태롭게 리어카를 밀고 가는 도로 상의 위험한 노인들, ‘혹독한 생’이 앞을 가려 눈시울이 시리다.
도처에 수시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특히나 요즘엔 ‘초미세 먼지’가 노년의 건강을 위협한다. 갈수록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쾌락이 만연한 시대에 시인은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소외된 그늘에서 찾고 있다. 일찌감치 직업 일선에서 물러나 존재감을 잃고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진 그들에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예 애초부터 없었나 보다.
하기야, 정부가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재주부리는 기초 연금, 노령연금 따위에 수시로 농락당하는 어르신들이다. ‘헌 옷 함‘ 기웃거리며 생계를 꾸리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민낯이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문제의식 보다는 정서적인 존재감을 안겨드리는 게 더 급선무다. 돌아갈 고향마저 잃고 변방에서 유목민이 되어 거꾸로 걷는 사람들, 앙상한 몰골로 ‘어룽이는 그림자’, 시인은 잠시 ‘비스듬히’ 텅 빈 허공을 맹탕으로 깨물어 버릴 듯 응시하고만 있다.
여기서 잠깐 지은이의 ‘시작 여담(詩作 餘談)’을 듣고 이 글의 음영(陰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TV를 켜다 보면 낡은 리어카를 끌며 재활용품을 주워 모으는 사람들의 후줄그레한 모습을 접할 때가 있다. 재활용품과 헌 옷 함을 전전하면서 그것을 옮겨 담는 사람. 어둡고 구석진 곳을 배회하는 후줄근한 실루엣에 마음이 아리다.
‘스카이 캐슬’에 사는 사람들과, 살아남는 그 자체만으로도 버거워 보이는 삶. 분명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가장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련만, 아무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도 쉽사리 해결 안 되는 또 다른 우리네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