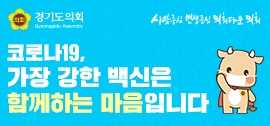경남 울산 예신대 문창과 졸업, 동아일보 소설 등단, 신동아 논픽션 최우수상 수상
시집 : 허물 벗는 시간, 도시 속에 허수아비, 그대 숲 속에 간이역을 짓고, 머시라카노
소설: 마지막 길동무, 시간을 접는 사람들, 거꾸로 걷는 사람, 얼음아이, 자투리, 매니큐어

젊은 햇살이 우쭐대며
담장을 넘어 오던 날
남자는 장독대로 가 망설이다
항아리 뚜껑을 연다
메주보다 못 생긴 아내가 웃고 있다
아내의 입술을 뚝 떼어 담는다
생일 날 된장국이냐
투덜댄 부끄러움이
부러워지는 날
아내가 싫어하는 소주병에
국화꽃을 꽂는다
짜고 맵고 쓰디쓴 잔소리를
삭힐 수 없었던 아쉬움에
아내의 빈 자리 꽃병과 마주한다.
시 읽기/ 윤형돈
부부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곱씹어 본다. 맨 처음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남녀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 서로가 이질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외계인으로 만나서 매일 한 지붕 아래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나마 인연이 지어준 실타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부부는 행복하다. 삶이란 지루하고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동고동락한 세월이 어느덧 늙고 병 들면 어느 한 쪽에 기대고 싶기도 하다. 도중에 쉽사리 체념하지 못하는 천륜(天倫)의 도리는 불가마 속에서 질그릇 항아리를 만드는 과정만큼이나 불의 연단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왔기 때문이리라!
시인은 한때 삶의 길목에서 만난 사람과의 애환과 연민을 항아리에 담아 순정한 시로 빚어냈다 여기서 두 사람의 형상처럼 생긴 배불뚝이 장독은 가쁜 숨 몰아쉬며 말없이 부부생활을 뒤 곁에서 엿본다. 그런데 시의 온상인 그 ‘장독대’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수시로 뚜껑을 열어 쪼여주면서 숙성 발효 시켜야 제 맛이 난다는 이치와 잘 맞아 떨어진다.
여기 장독대 항아리에는 부부의 내밀한 사연이 담겨 있다 장맛처럼 달고 쓰고 신맛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겉은 단단해 보여도 상처받기 쉽고 잘 깨진다. 강한 척 해도 속으로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 ‘젊은 햇살이 우쭐대며 담장을 넘어오던 날’은 결혼생활의 단꿈을 꾸던 시기였을까? ‘장독대로 가 항아리 뚜껑을’ 여는 이유는 뚝배기 남자가 모처럼 옹배기 아내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였다 망설이다 뚜껑을 여니 ‘메주보다 못 생긴 아내 얼굴이 웃고’ 있단다.
은근짜 호감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그 날이 하필 아내 생일이었던 모양이다 당연히 ‘머시라 카노, 생일날 웬 된장국이냐’ 아내가 투덜거렸겠지만, 티격태격하던 날마저 지금은 아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립고 아쉽고 부러워지기까지 한다. ‘메주보다 못 생긴 아내’였지만, 오늘은 살가운 아내의 부재가 절실하다. 평소 그토록 ‘싫어하는 소주병에’ 정절의 국화꽃을 꽂고 진정 회개하고 싶은 심정이다.
‘아내의 입술’과 같은 된장 덩어리를 뚝 떼어 담는 모습이 유머러스하면서도 ‘아내의 빈자리’에 알 수 없는 연민의 정이 스민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마누라’라고 하지 않았나. 불 속을 헤쳐 나가는듯한 이 세상의 모진 시련을 함께 겪기 전까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맘때 ‘달 항아리 여인’의 순정어린 전설이 떠오르면서 얼핏 ‘항아(姮娥)’라는 달에 산다는 신비의 여인을 생각해 본다. 항아리 수제비라도 먹고 싶은 오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