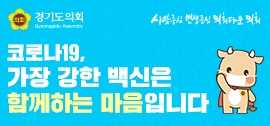‘경인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영혼은 승리를 향한 비상을 위해 '은빛 날개'를 힘껏 펼쳤다” 백제의 대장군 계백의 말이라는 설도 있으나 사실 이 말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게임의 지도를 설명하는 문구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의 내 처지가 딱 그 짝이다. 6년간 동고동락했던 ‘경기리포트’를 통해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렸다고 행각하며 이 신문 저 신문사를 전전하기를 이 년이나 했다. 나이 들어 신문사를 옮겨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일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었다. 격하게 기사를 쓸 일도 없고 그저 보도자료를 조금 고쳐가며 가끔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전부인 2년간의 생활에서 스스로 무디어져 갔다.
가끔은 어느 지방지의 일면을 장식한 멋진 기사를 보고 “참 어려운 기사를 용케도 잘 썼구나!”라며 응원을 보내면서도 더 이상 나는 그럴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스스로는 더 이상 격한 취재의 현장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 아직 경기리포트가 마음에 남긴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시간이 나는 대로 산성답사를 다녔다.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의 산성에 대해 조금씩 배워가며 알아가는 중 문득 다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2017년의 봄기운이 워낙 따뜻하고 좋아서일까 싶다. 춘심이 충동질 하는 그날 소주 한잔에 차를 두고 걸어가는 길이 좋았다. 봄꽃이 아직 덜 피어 꽃망울들만 가지런히 담장 밖으로 이어진 길에서 아직도 글품 팔이나 하는 내가 조금은 서글퍼 보였다.
자정이 지나 담배를 피기 위해 옥상에 올라앉았다. 달무리도 좋고 달도 예쁜 것이 방긋 방긋 웃는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선배기자가 나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근묵자흑(近墨者黑)에 유유상종(類類相從)”만 하지 않으면 오래 살 것이라 했던 말이 떠올라 피식 웃어 본다. 어둠과 불빛만 가득한 세상에서 처량 맞게 옥상에서 피는 담배연기와 달빛이 참 곱기도 하다. 세상이 다 고운데 나만 곱지 못한 것은 마음에 무게를 덜지 못한 탓이리라
며칠이지나 신문사는 그만뒀다. 그리고 도청에 가서 언론사 신고를 하고 다시 해보기로 했다. 무겁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지고 실성한 사람마냥, 봄꽃처럼 혼자 실실대며 웃었다. “또 할 거야”라는 안 사람의 잔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생계는 어떻게”라는 물음이 오히려 기뻤다. “늘 그렇지 뭐!”
몇 날을 은행에 들락거리는 시간을 보내고 사무실을 차리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준비했다. 기사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밤을 새워가며 새기사를 채워 넣었다. 피곤한 것도 잠시 잊은 듯 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내일 새 출발을 하려고 하니 문득 다시 그 문구가 떠오른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응어리처럼 남아 있던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내게 한마디 했다. “잘했어”라고 말이다.